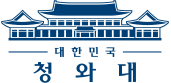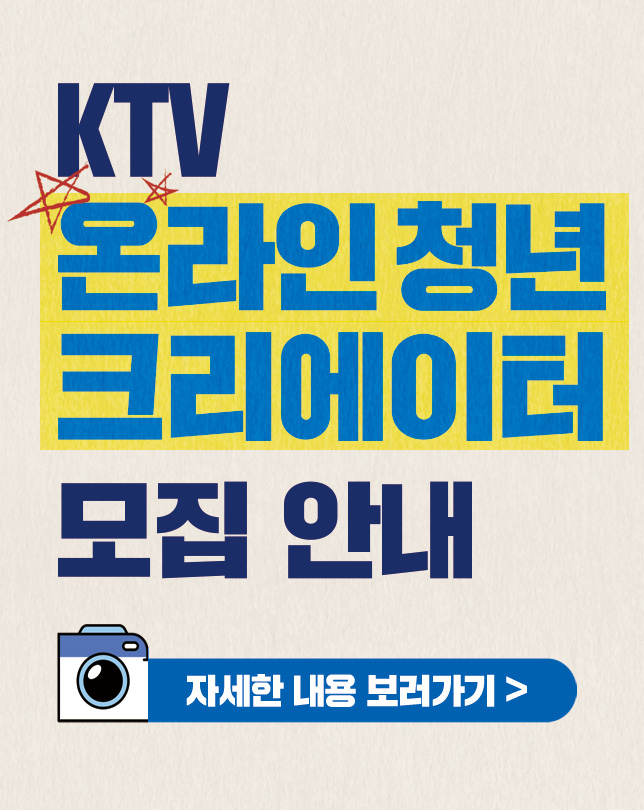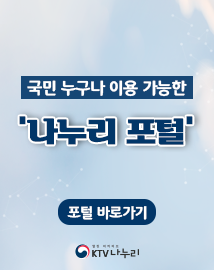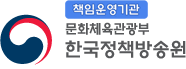앞서 보신 것처럼 시장개방으로 인해 우리 농촌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한미FTA뿐 아니라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우리 농업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박영일 기자>
현재 우리 농촌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는 인력구조 고령화와 특화된 상품의 부재.
따라서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농업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립니다.
한미FTA 체결로 농촌의 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실상 이는 한미FTA가 아니었어도 우리 농촌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입니다.
“WTO체제 안에서 2015년이면 쌀도 관세개방된다, 이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국경간 무역 장벽을 없애는 것이...”
물론 시장개방으로 야기될 농가의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해 주는 소득보전직불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방식은 생산품목 기준이 아닌 농가가 기준이 된 농가단위 직불제 시행이 유력합니다.
“농가단위 직불제 도입할 것이다. 농가별 생산품 데이터베이스하는 등의 추가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농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구조 개선을 어렵게 만들 것이란 지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미 FTA로 인한 단기적인 충격을 보상하는 단기적 또는 1회성 보조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장기적으로 현재의 농업구조를 고착화 시키는 보조정책은 삼가야 한다.“
결국, 앞으로 남은 숙제는 장기적으로 우리 농촌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개방화시대에 맞는 체질을 갖추는 데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본문
KTV 국정와이드 (333회) 클립영상
- `국회는 파업중` 48:10
- `국가적 손실 막대` 48:10
- `국민에게 보고해야` 48:10
- `연착륙` 성공 48:10
- 한 총리 `종부세 관련법 손댈 생각 없다` 48:10
- `노인요양 신청하세요` 48:10
- 4월 수출 17.8% 증가, 8억달러 흑자 48:10
- 아는 만큼 안전 48:10
- 제외 가능성 48:10
- 남북, 2일 개성서 경공업 실무회의 48:10
- `보복폭행` 곧 구속영장.. 사건 경과 48:10
- 반세기만의 개혁 48:10
- 적응 돕는다 48:10
- 물가 안정세 속 공공요금 다소 상승 48:10
- `무연고 동포` 방문취업 국가별 할당 확정 48:10
- 관세청, 마약류 특별단속본부 발족 48:10
- 공무원 자원봉사자 2만8천명 48:10
- 순간포착 48:10
- 이제 유럽이다 48:10
- `불만`서 `만족`으로 48:10
- 과대포장, 누가 하나 48:10
- 소비자가 결정 48:10
- 농촌 `구조 개선` 48:10
프로그램내 인기영상
최신뉴스
- 유라시아의 심장 '카자흐스탄'서 피어난 K-컬처! [세계 속 한국]
- 나에게 주는 하루의 휴가···당일치기 여행지 추천 [여행을 떠나요]
- 강원 삼척 인근 바다서 규모 2.5 지진···"안전 유의"
- 도수치료 '고무줄 가격' 사라진다···정부가 직접 관리
- 항공교통량 100만 대 돌파···국제선·통과비행 영향
- 대미 투자 협상 본격화···실무협상단 방미
- 1월 수출 역대 최대···반도체·자동차 호황
- "담합 행위는 암적 존재···시장 영구 퇴출 적극 검토"
- 청와대 브리핑 - 대수보회의 결과 관련
- 러, 쿠바 제재 반발···"미 제재 수용 못 해" [글로벌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