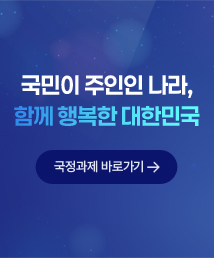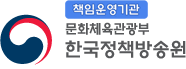김담희 앵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글'인데요.
과거 일제강점기에 한글 역시 숱한 탄압을 받았지만 우리 뜻있는 지식인들이 목숨처럼 지켜왔습니다.
'광복의 달'인 요즘 희생과 고난 속에 한글을 어떻게 지켜냈는지 보여주는 전시가 관심을 끄는데요.
권유진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유진 국민기자>
(서울시 용산구)
서울의 한 거리, 상가 간판에서 '닭도리탕'이나 '오뎅' 같은 글자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인 '닭볶음탕'이나 '어묵'이 있지만, 일제강점기에 썼던 일본말이 이처럼 우리 생활 속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 박경란 / 서울시 관악구
"어릴 때부터 일상적으로 썼으니까 그 말이 일본어인지 인식 자체를 못하니까..."
인터뷰> 이준 / 인천시 서구
"일제 잔재 용어들도 잊지 않고 이것을 최대한 지양하는 방향성으로 한국 사회와 국민 모두가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립한글박물관 / 서울시 용산구)
이곳은 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어떤 표기 체계가 소통에 도움이 될 것인지 세종이 백성을 생각해 만든 <용비어천가> 등 다양한 한글 관련 옛 자료를 볼 수 있는데요.
한글이 위기를 맞은 것은 일제강점기 시대, 1923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보통학교용 조선어독본> 책입니다.
국어가 아닌 조선어라는 책 제목에서 보듯 우리말을 주 언어가 아닌 보조언어로 취급했습니다.
그나마 있었던 조선어 수업 시간과 횟수를 줄이고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희재 / 국립한글박물관 학예연구사
"일제강점기 후반으로 갈수록 한글 탄압이 강해졌는데요. 많은 이들이 우리말과 글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쉽게 한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 탄압에 굴하지 않았던 우리 지식인들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 바로 우리말의 어휘를 모은 <말모이> 원고, 한글학자인 주시경이 1911년부터 제자 세 사람과 함께 만들어낸 역작입니다.
이후 제자들은 1921년 '조선어연구회'를 조직한 데 이어 1931년에 '조선어학회'로 이름을 바꾼 가운데 '한글 맞춤법'부터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보시는 것은 <한글맞춤법통일안>, 1930년부터 3년 동안 백 이십여 차례에 걸친 치열한 회의를 거쳐 이뤄낸 것으로 이를 통해 훗날 우리 사전을 펴내는 밑거름이 됐는데요.
1929년 방정환이 펴낸 <어린이> 잡지, 어린이들이 제 나라의 말과 글을 잃지 않도록 글쓰기와 맞춤법 지도 등의 내용을 실었습니다.
관람객들은 선조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희생에 옷깃을 여밉니다.
인터뷰> 백현찬 / 서울시 동대문구
"저희 선조들이 힘들게 지켜온 우리 한글을 더욱 소중히 생각하고 사용했으면 좋겠고..."
광복 이후에 나온 '조선말 큰사전'은 일제 탄압을 이겨낸 대표적인 성과물인데요.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면서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좀 더 나은 삶과 문화를 누리는 세상, 반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광현 / 경기도 용인시
"외래어인지 한국어인지도 잘 모르는 간판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부터 정비해야 할 것 같고요."
인터뷰> 박복희 / 국립한글박물관 전시해설 봉사자
"젊은 친구들이 말 줄이기를 한다거나 엉뚱한 말을 해서 한글이 오염됐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일제 탄압 등 한글 관련 유물 천 백여 점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 실감 영상 등 첨단정보기술 미디어를 통해서도 전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취재: 권유진 국민기자 / 촬영: 이선형 국민기자)
세종이 만들고 선조들이 지켜온 우리 한글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큰 수난을 겪었는데요.
뜻깊은 광복의 달을 맞아서 한글의 정체성을 잘 이어가는 데 모두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권유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