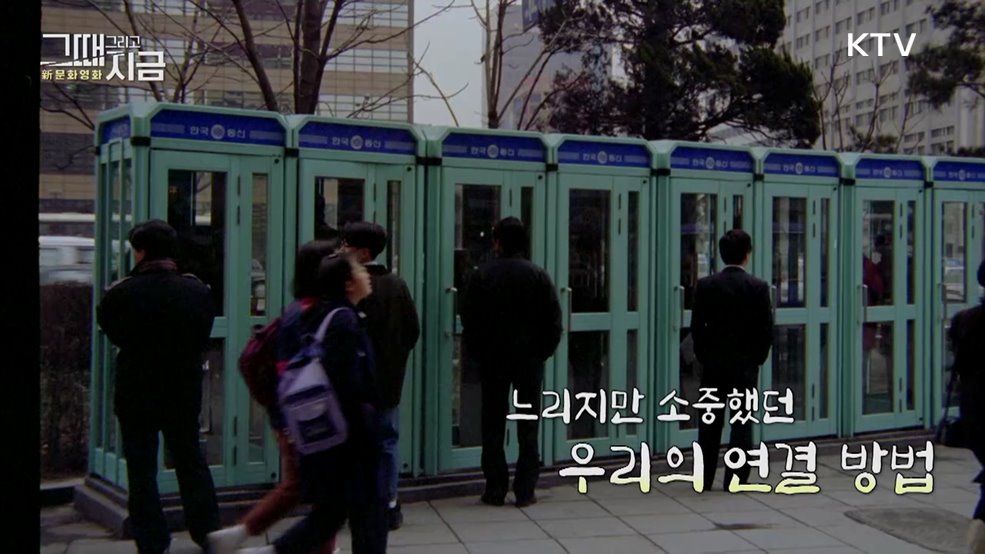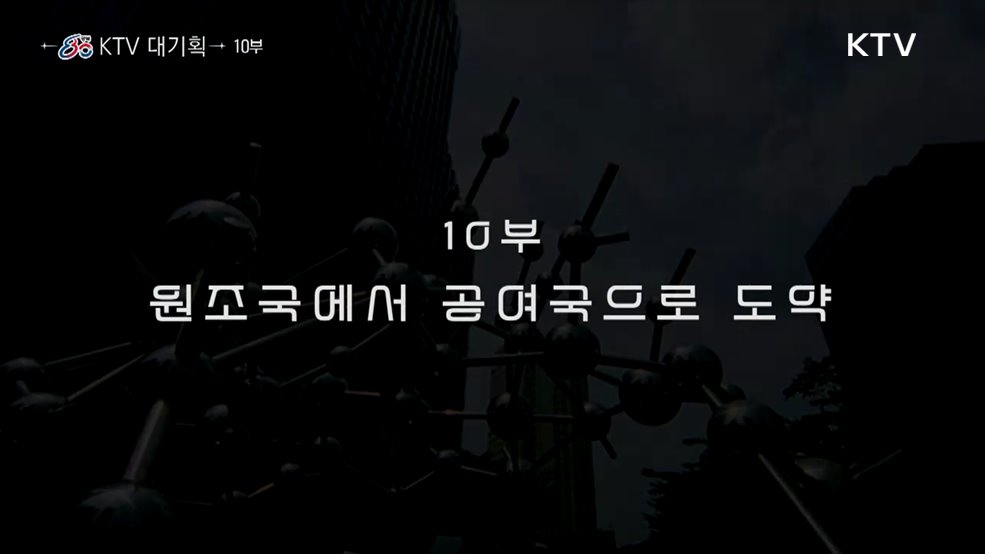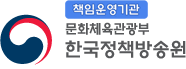본문
시청자의견
[지평선] 관악산 방폐장
한국일보 1/14 30면 기사 발췌
김수종 수석논설위원 sjkim@hk.co.kr
우리는 전기문명의 한가운데에 살고 있다. 생활의 모든 분야가 전기코드와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다. 요즘 기업과 매체가 ‘웰빙’이라는 말을 소비생활
의 새로운 테마로 띄우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도 전기문명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쓰는 전력의 약 40%를 원자력이 담당한다.
이만한 양의 전력은 수도권 전체가 필요한 전력과 맞먹는다. 이렇게 원자력
의 혜택을 받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원자력으로 파생되는 부작용에 몸살을
앓고 있다. 바로 핵폐기물 처리 문제다. 이 이슈의 본질은 ‘안전성’이라는 기
술적인 문제와 ‘수용성’이라는 정서적 문제가 얽혀 있다.
■ 핵폐기물이 유해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사용 후 연료는 수
만년간 방사능을 뿜어내는 독성 물질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험물질을 격
리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다수 과학자들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 선진국이 모두 지하보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압축처리 및 보관기술의 발달로 폐기물
관리는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가동중인 원전임시보관
소 보다는 영구시설을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한
다. 대체로 공감을 준다.
■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수용의사다. 그것은 안전성에 대한 과
학적이고 기술적인 신뢰를 기초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
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다. 안면도에서 시작해 위도에 이르기까지 17년 동
안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에 실패한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문가의 안전성 진단과 정부의 의지만 갖고 행정편의적으로 일을 추진했
기 때문에 조그만 난관을 만나도 일이 일그러지고 만 것이다. 부안 사태의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
■ 서울대 교수들이 관악 캠퍼스에 방폐장을 유치하자는 제안을 해서 또 한
차례 논쟁이 벌어졌다. 기발한 아이디어였지만 현실성은 희박했다. 그러나
교수들의 제안이 문제해결에 새로운 자극을 준 면이 있다.
이유는 두 가지. 첫째,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수도권 주민들이 이 문제를
막연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구체적인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화석연료 원자력 대체에너지 등을 종합해서 현실적인 대안
을 중심으로 21세기 에너지 정책을 재조명할 기회다. 즉 원자력이 차지할
비중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장 문제의 돌파구
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일보 1/14 30면 기사 발췌
김수종 수석논설위원 sjkim@hk.co.kr
우리는 전기문명의 한가운데에 살고 있다. 생활의 모든 분야가 전기코드와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다. 요즘 기업과 매체가 ‘웰빙’이라는 말을 소비생활
의 새로운 테마로 띄우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도 전기문명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쓰는 전력의 약 40%를 원자력이 담당한다.
이만한 양의 전력은 수도권 전체가 필요한 전력과 맞먹는다. 이렇게 원자력
의 혜택을 받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원자력으로 파생되는 부작용에 몸살을
앓고 있다. 바로 핵폐기물 처리 문제다. 이 이슈의 본질은 ‘안전성’이라는 기
술적인 문제와 ‘수용성’이라는 정서적 문제가 얽혀 있다.
■ 핵폐기물이 유해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사용 후 연료는 수
만년간 방사능을 뿜어내는 독성 물질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험물질을 격
리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다수 과학자들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 선진국이 모두 지하보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압축처리 및 보관기술의 발달로 폐기물
관리는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가동중인 원전임시보관
소 보다는 영구시설을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한
다. 대체로 공감을 준다.
■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수용의사다. 그것은 안전성에 대한 과
학적이고 기술적인 신뢰를 기초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
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다. 안면도에서 시작해 위도에 이르기까지 17년 동
안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에 실패한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문가의 안전성 진단과 정부의 의지만 갖고 행정편의적으로 일을 추진했
기 때문에 조그만 난관을 만나도 일이 일그러지고 만 것이다. 부안 사태의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
■ 서울대 교수들이 관악 캠퍼스에 방폐장을 유치하자는 제안을 해서 또 한
차례 논쟁이 벌어졌다. 기발한 아이디어였지만 현실성은 희박했다. 그러나
교수들의 제안이 문제해결에 새로운 자극을 준 면이 있다.
이유는 두 가지. 첫째,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수도권 주민들이 이 문제를
막연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구체적인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화석연료 원자력 대체에너지 등을 종합해서 현실적인 대안
을 중심으로 21세기 에너지 정책을 재조명할 기회다. 즉 원자력이 차지할
비중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장 문제의 돌파구
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
- 다음글
- 반핵단체는 대체 언제까지 핵폐기장을 막을 것인가? 2004.01.14
-
- 이전글
- 반핵단체의 원자력 기형발생 거짓말 200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