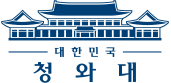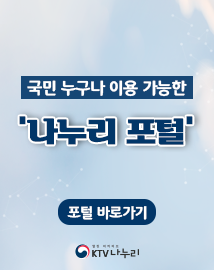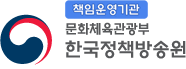영화를 보는 눈을 높이는 시간이죠.
독립영화를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맹수진 영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맹수진입니다.
영화와 말로 인생의 희로애락이 모두 담긴 예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Q1> 오늘은 어떤 영화로 저희를 울고 웃게 해주실건가요?
A1>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경원 감독의 영화 <경북 문경으로 시작하는 짧은 주소>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오래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어나서 자란 터전을 떠나 외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장해온 공간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경북 문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서정적인 음악과 노랗게 익어가는 들녘의 벼와 하늘, 공기 등 아름다운 풍경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문경을 배경으로 한 가족의 이야기와 함께 소녀의 성장을 잔잔하게 풀어냈고요. 쇠락해 가는 소도시에서 망설이고, 때론 용기 내며 살아가는 인물들의 모습을 마음 짠하게 담아낸 작품입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도 호평을 받았죠.
네, 그럼 이경원 감독의 <경북 문경으로 시작하는 짧은 주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경원 감독의 <경북 문경으로 시작하는 짧은 주소> 만나봤습니다.
Q2> 주인공 ‘은아’가 고향을 떠나는 모습을 보니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떠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 농촌의 현실인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A2> 영화 전반부에 여주인공 은아가 이 단조로운 소도시에서 홀로 된 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어린동생에게도 엄마이자 누나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 그려집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가족을 위해 미뤄왔던 그림을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로 갈 것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은아의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결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은아의 떠남은 이곳에 남은 이들에게 또다른 공백, 빈자리의 허허로움을 안겨주게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거 꼭 거기가야 할 수 있는거냐고” 묻게 됩니다.
관객들도 역시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데요.
정말 은아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반드시 서울로 가야만 하는 걸까-하는 그 질문에 대해, 우리는 정답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영화를 보면 은아가 느끼는 답답함과 슬픔만큼은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 작품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속에서 자신의 삶에 결핍감을 느끼며 오랫동안 살아온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의 쓸쓸함. 그리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헤어져야했던 가족들의 애잔함.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슬픔같은 것인데요.
이 영화는 아름다운 풍경과 토속적인 사투리, 절제된 카메라 움직임 속에서 그 슬픔을 잔잔하게 잡아냅니다. 그것은 어쩌면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삶의 계급적 구획선이 되어버린 우리사회의 한 풍경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죠.
Q3> 네, 그럼 영화를 만든 이경원 감독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이 작품은 왠지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Q4> 영화 속에 할머니가 등장하셔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A4> 재미있는 것이, 많은 영화 속에서 부모는 오히려 원망과 애증의 대상인 대신에. 조부모, 특히 할머니는 애정과 그리움의 대상으로 등장하곤 하죠.
이 영화 속에서도 손녀인 은아와 할머니의 애착관계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서울로 떠나는 날도 할머니를 연상하게 하는 할머니를 보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죠.
여기서 할머니는 단지 그리움의 의미가 아니라- 고향을 떠나는 은아가, 마찬가지로 고향을 떠나 살아오신 할머니에게서 느끼는 동질감이기도 하다는 거죠.
할머니께서도 제주도에서 물질하던 해녀 아가씨가 경북 문경까지 시집을 왔을 때는, 할머니 나름의 꿈과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있었을 텐데요. 결국 할머니가 가진 마지막 소망은 고향 제주도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그 꿈은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게 될 은아에게는 더 큰 슬픔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는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가고 싶어 하는 은아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할머니의 상반된 움직임을 통해서 ‘떠남과 돌아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Q5> 네, 이렇게 가족과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다보면 상당히 감상적이 되기 쉬운데 정도를 잘 지키신 것 같아요.
A5> 네, 영화는 정서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담고 있으면서도. 인물들에게는 깊이 개입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감독님께서 촬영에서부터 염두에 두신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감독님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감독님께서 은아는 서울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Q6> 그런데 인상적이었던 것이. 은아가 떠날 때, 반대로 문경으로 내려온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A6> 사실 이 영화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떠남과 돌아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영화의 마지막 장면 역시, 이 주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서울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은아 앞에 젊은 남자가 ‘경북 문경으로 시작하는 짧은 주소’를 내밀며 길을 물어보는데요. 그 주소는 바로 은아의 이름을 딴 아버지의 부동산 주소입니다. 그리고 상원을 향해 은아는 “거기 살기 좋아요. 잘사세요.”라고 말하죠.
이렇게 영화는 누군가 떠나려는 곳에 다른 누군가가 돌아오는 스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은아, 그리고 할머니와 은아가 떠남과 돌아옴 사이에서 스치며 서성거리듯이. 이 영화를 보는 관객 역시 떠나려는 마음과 돌아가려는 마음 사이에서 머뭇거리게 되죠.
이 영화는 그 머뭇거림의 정서- 상실감, 애잔함을 영상 안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안개가 꽉 찬 마을 풍경. 바람에 흔들리는 보리밭 등의 풍경과 사물의 시정을 통해 영화는 구체화된 말과 치밀한 내러티브를 대신해 주제를 전달합니다. 참 시적인 영화라고 하고 싶네요.
네, 오늘 이경원 감독의 <경북 문경으로 시작하는 짧은 주소> 만나봤습니다.
Q7> 마지막으로 오늘 영화 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7>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오늘 토요일부터 ‘이탈리아 영화 특별전’이 시작됩니다. 1940년대에서 90년에 이르기까지 찬란했던 이탈리아 영화예술을 장식했던 8편의 영화가 무료로 상영되는데요. 누벨바그 감독들에게 현대 영화의 진정한 출발점이라 칭송받은 로베르토 로셀리니 감독의 1954년작 <이탈리아 여행>처럼, 영화사의 의미 있는 작품은 물론이고요. <시네마 천국>처럼 더 이상 유명할 수 없는 작품도 극장에서 다시 보실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잉그리드 버그만’과 ‘알랭 들롱’의 전성기 시절 모습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어떤 영화들이 상영하는지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네요.
뿐만 아니라 영화 상영 기간 동안,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이탈리아 영화 오리지널 포스터 전시회>도 함께 진행 된다고 합니다. 찬란했던 이탈리아 영화예술을 한 눈에 보실 수 있으시겠네요.
네, 맹수진 선생님.
오늘도 좋은 영화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