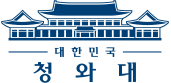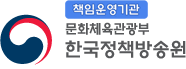정희지 앵커>
우리나라 근대교육이 시작된 지도 1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뜨거운 교육열은 대한민국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됐는데요.
한 세기가 넘는 서울교육의 현장과 역사를 김제건 국민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김제건 국민기자>
대한뉴스 제1545호, 1985년
"이 땅에 신교육의 횃불을 올린 배재학당이 개교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대한뉴스 제1595호, 1986년
"1886년, 서울 상동에 한옥 단칸방에서 단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이화학당은 100년의 세월 속에 수많은 여성 인재를 길러내면서..."
1895년 2월, 고종의 교육입국조서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교육 시발점이던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이 정식 문을 열고 100년이 넘는 동안 유관순 열사 등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대한뉴스 제373호, 1962년
"온 국민이 의무교육 즉 국민학교 교육에서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교부에선 학령아동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교사의 신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육 시설의 확충 계획을 세우고..."
1894년, 최초의 초등학교인 교동초등학교의 개교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학교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뉴스 제106호, 1957년
"3월 6일부터 서울 시내 60여 개 전기중학교에서 일제히 입학시험이 시작되어 상급 학교에 문을 두들기는 어린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1900년, 관립 중등학교가 문을 열었는데요.
시험을 보고 진학을 교육 제도가 도입되면서 입시 과열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원정상 / 서울시 성동구
"서로 입시경쟁을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놀 건 다 놀고 그랬지, 입학시험 준비를 위해서 운동도 안 하고 친구들과 놀고 그런 걸 소홀히 한 적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학교 100년' 기획전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학교 100년‘을 되돌아보는 자료들이 한곳에 모였습니다.
소학교가 생겨난 역사부터 일제강점기에 민족정신을 말살한 교육 현장도 보여줍니다.
6·25 전쟁 이후엔 2부제, 3부제 수업은 보통이었고, 1960년대 무즙 파동과 창칼 파동 이후, 국민교육헌장이 나왔습니다.
68년 중학교 무시험제, 74년 고교 평준화 등 새로운 교육제도가 생겨나고 1980년대에 강북중심의 교육이 강남으로 이전했습니다.
입시교육의 단점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도입됐지만 교육 열기는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
인터뷰> 원정상/ 경복고 수험·성적표 기증자
"우리나라가 발달한 제일 큰 원인이 학부모들의 교육열이죠. 본인이 못 했던 걸 한 푸는 것도 있지만,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모든 걸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 정신이 현재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제일 큰 밑바탕이 됐고..."
인터뷰> 김재경 /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한 세기 동안의 교육역사를 기증유물을 통해 살펴보고요. 그 기증 유물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이고 개인의 일상사가 현대사, 교육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획하게 됐습니다."
(취재: 김제건 국민기자)
시대의 흐름과 함께 많은 변화를 겪어 온 우리나라 근현대 교육.
요즘은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인성에 기반을 둔 창의 인재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국민리포트 김제건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