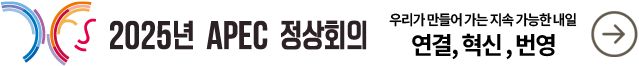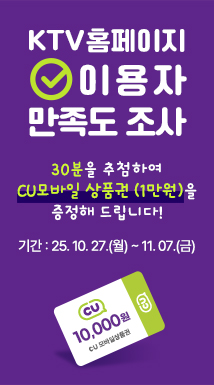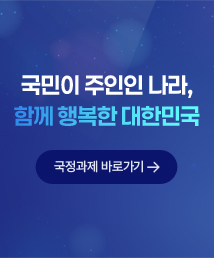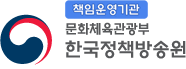최근 중국의 쓰촨성 대지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진 안전지대로 알려진 우리나라지만, 재해 발생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데요. 지진에 대한 과학적 관측과 대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김미정 기자>
2008.05.12 중국 남부 쓰촨성, 규모 7.9 강진 발생.
2008.05.27 현재 사상자 8만6천여명, 재산피해 10조원.
원자폭탄 마흔개의 위력과 맞먹는 쓰촨성 대지진.
그곳에서 불과 2천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는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일까.
지진은 지구를 둘러싼 대륙판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경계부분이 부딪히면서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해 판의 경계에 위치한 중국과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진 횟수가 적고, 규모도 미미한 편입니다.
지난 1978년 기상청 관측 이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지진은 모두 732회.
연평균 25회쯤 발생한 셈입니다.
지진은 그 크기에 따라 절대적 규모는 1에서 9까지로 나뉘고, 사람이 느끼는 체감 정도에 따라선 진도 1에서 12까지 나뉩니다.
쓰촨성 지진처럼 규모 7.9 정도면 건물은 완전히 파괴되고 철로가 휘어지며, 지면에 단층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쓰촨성에서 발생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지진의 세깁니다.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진의 규모가 클 경우 시설물 붕괴 등에 따른 화재와 물난리, 감염 등 2차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쓰촨성 대지진 이후 댐 붕괴의 위험이 커져 인근 주민들이 모두 대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연구센터에선 한반도 곳곳에서 측정된 지진 관련 자료가 실시간으로 들어옵니다.
오전 11시, 상황실 내 모니터에 빨간 불이 켜집니다.
포항 호미곶과 멀지 않은 곳에서 지진파가 감지된 겁니다.
이처럼 전국 35곳의 지진관측소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지진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만에 하나 닥쳐올지 모를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전국의 각 교량과 공항 등 국가 주요시설물과 지자체의 도시가스배관에도 관측계가 설치돼, 지진 발생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습니다.
이곳에서 보유한 이동식 지진관측계도 10여개.
지진 발생 후 나타나는 여진의 가능성과 지반 탐사에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지진연구센터는 향후 각 지자체와 연계해 지진 신속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독도에도 지진 관측계를 설치해 독도 주변 동해상까지 관측한다는 목표 입니다.
지진 발생 가능성으로부터 결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나라.
과학적 관측을 통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