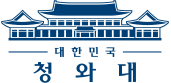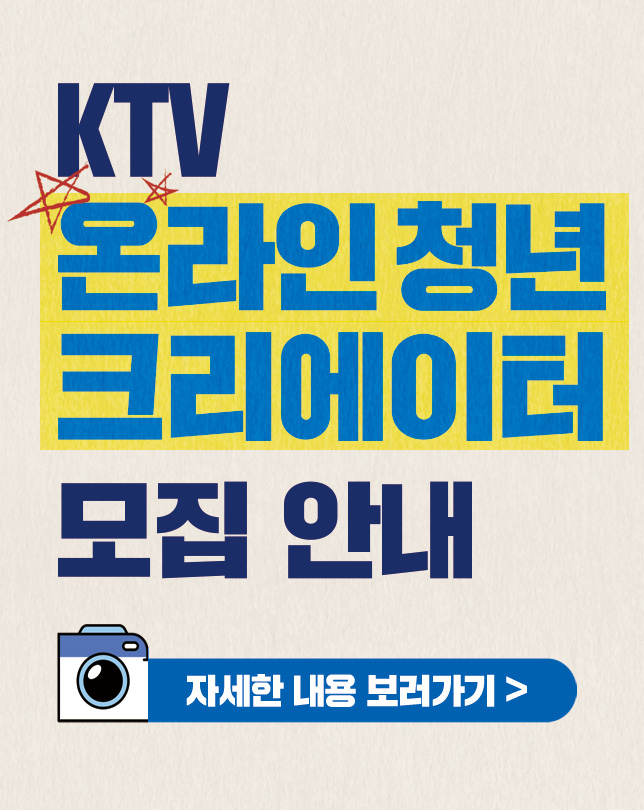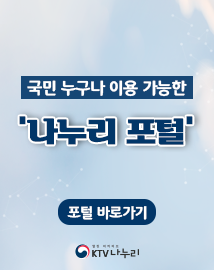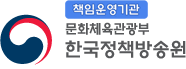장마가 끝났는데도 오히려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걸 보면서, `요즘 날씨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장마 대신에 `우기`라는 개념을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정연 기자>
장마가 끝난 8월, 하지만 쨍쨍 내리쬐는 햇볕은 좀처럼 보기 힘들었습니다.
집중호우를 포함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8월에 내린 비의 양이 오히려 40일 가량 지속된 장마 기간보다 많습니다.
이 비는 기상학적으로 장마와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장마는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해 기단이 만나 형성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발생하지만, 장마 뒤에 쏟아진 집중호우성 폭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며 대기가 불안정해졌고 덥고 습한 공기가 이 기압골을 타고 올라오면서 발생했습니다.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열대야가 발생한 날수도 평년보다 많았습니다.
이렇게 여름철 강우 형태가 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를 꼽습니다.
온난화가 심해질수록 대기중에 수증기가 늘어 대기가 더욱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상청이 서울과 강릉 등 전국 여섯개 도시의 여름철 강수량을 조사해봤더니, 1980년 이전엔 장마철에 비가 집중돼 7월 강수량이 가장 많았지만 1980년부터 2004년까지의 평균 강수량은 장마가 끝난 8월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할 수 없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20일 기후전문위원회를 갖고 장마 이후에 비가 더 자주 오는 현상에 대해 논의하고 `우기`를 포함해 새로운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일차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수백년 이상 장마라는 개념이 통용돼 온 한반도에 아열대 기후개념인 `우기`를 기상 예보에 도입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우기를 규정하는 데 따르게 될 사회.문화적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장마가 우기에 포함되는 개념이어서, 이 둘을 이분법적으로 구분지어 규정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장마와 우기의 개념에 대해 학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에도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본문
KTV 국정와이드 (408회) 클립영상
- 정부 수해복구 장비지원 검토 47:33
- 북한 수해, 대선에 이용하는 것 옳지 않아 47:33
- 노무현 대통령, `北 수해지원 지혜 모아달라` 47:33
- 청와대 브리핑 47:33
- `北 수재민 30여만명`, 농작물 피해 사상최대 47:33
- 사상 최대폭 `상승` 47:33
- 상장사 상반기 순익급증 47:33
- FTA 무역피해 `지원대상 확대` 47:33
- FTA 가속화 대비 관세제도 선진화 47:33
- 美쇠고기 수입재개 여부, 주중에 결정 47:33
- 탈레반, 죄수 23명 석방 고수 47:33
- `인권보호`? 47:33
- `우기` 도입 논의 47:33
- 안전성 조사.감시 강화 47:33
- 인구이동 `감소` 47:33
-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회의 개최 47:33
- 버시바우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촉진 희망` 47:33
- `수시 2학기` 총정원 50% 선발 47:33
- 한·중 수교 `15주년 행사 열려` 47:33
- 수단, 여행제한지역으로 지정 47:33
- `주파수 경매제` 도입 될 듯 47:33
-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시작 47:33
- 산림청 헬기추락 3명 사망 47:33
- 전력 최대사용량 6천154만kW 최고기록 47:33
- `안티스파이웨어 자동연장결제 주의` 47:33
- 순간포착 47:33
- 국무회의 브리핑 4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