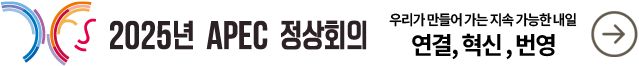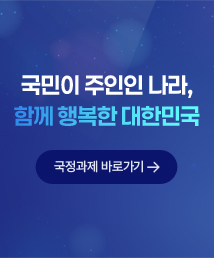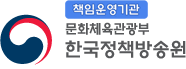여>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정치적 변수에 좌우되지 않도록 이산가족상봉을 정례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
순수 인도적 사안인 만큼 상황에 따라 변하는 남북관계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 역시 북한의 호응이 관건입니다.
표윤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대한적십자사에 상봉을 신청한 이산가족 가운데 80%가 70세 이상의 고령자들.
25일로 예정됐던 상봉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로 상봉 포기자가 속출한 가운데, 상봉을 며칠 앞두고 상봉 예정자가 고령으로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4천 여 명의 이산가족 사망으로 전체 상봉신청자 약 13만 명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7만 2천 여 명만 생존해 있는 상황.
하지만 아직도 가족의 생사라도 아는 이산가족은 전체의 6.3%, 가족과 상봉을 이룬 이산가족은 전체의 1.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3년 여 만에 열릴 예정이던 이산가족 상봉 마저 기약없이 미뤄지게되면서, 이산가족 교류방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된 이산가족을 고려해 가족들이 현재 살아있는 지 생사만이라도 우선 확인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2011년 통일부가 이산가족 1만 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생사확인을 가장 하고 싶다는 이산가족이 40.4%로 가장 많았고 대면상봉과 서신교환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상봉의 정례화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지난 2001년 남북 각 300명의 이산가족이 서신교환을 했고, 지난 2000년부터 모두 18차례의 가족 상봉이 이뤄졌지만, 정치적 변수에 따라 모두 중단된 일이 비일비재였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남북 실무접촉에서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조항에 약속했지만 이를 위해선 북한이 이산가족을 순수한 '인도적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합니다.
전화인터뷰>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나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연계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남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안정적 진행에 있어서 서로 다른 목표나 방식을 갖고 있다.."
또 우리와 조건은 다르지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통행 협정을 체결한 과거 동서독 사례와,
정치와 이산가족 문제를 성공적으로 분리시킨 중국과 대만 사례도 이산가족의 인도적 교류를 위해 참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