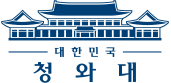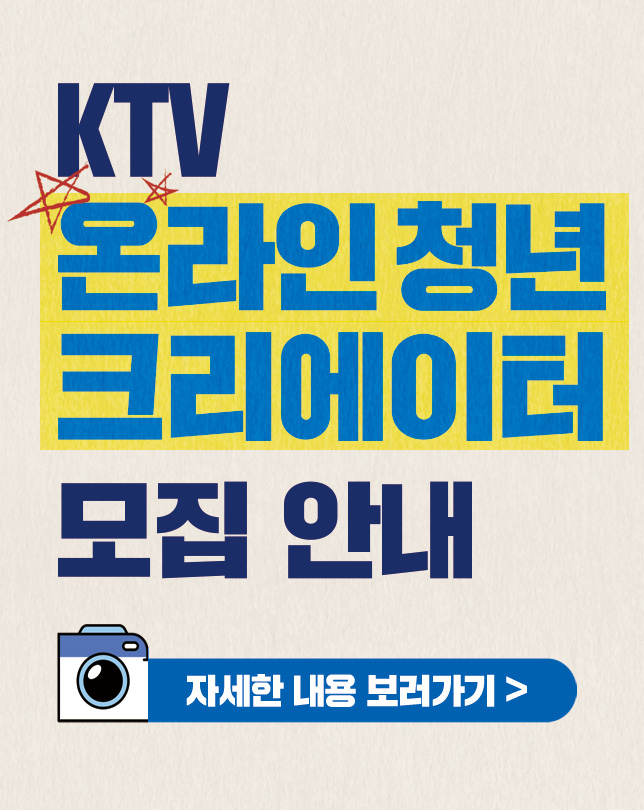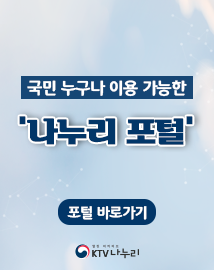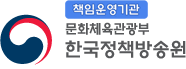참여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자정부 구축이었습니다.
지난 3년동안은 전자정부에 토대를 단단히 하는 시기였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스템들을 통합해 가동하는데 정부는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3년간을 함께 해온 전자정부의 현재를 보도합니다.
UN이 발표하는 전자정부 관련지수에서 한국의 전자정부 준비지수는 2003년 세계 13위에서 2005년에 이르러 5위로 참여지수는 12위에서 4위로 상승했고, 전자정부 발전 5단계 중 최고 수준인 통합처리 단계 진입률은 80%로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2003년부터 참여정부의 시작과 함께 추진돼온 전자정부 구축 사업이 세계적 수준까지 이르렀고, 올해를 기점으로 시스템의 통폐합을 통해 본격적인 전자정부 정착에 들어간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전자정부 사업이 시스템 구축단계에서 서비스 통합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투자 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사업관리를 효율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하드웨어적인 통합 이외에도 행정정보의 공유 추진과 함께 국민에게 다가가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2003년 행정정보 공유대상이 17종이던 것에서 2005년에는 24종으로 확대한데 이어 올해 7월부터 34종, 2007년 12월에는 74종까지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 같은 행정정보 공유 체계 혁신으로 행정업무가 간소화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전자정부 구축 사업은 인터넷 민원서비스 증가를 가져오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동시에 문서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터넷 민원 서비스 발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감사를 벌이고, 문서 위.변조 위험성에 대한 사후보완대책이 미흡했음을 시인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부는 위.변조 문제점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자정부 인터넷 서비스를 재점검하고 문서전송구간에서의 전자문서 이중암호화 조치 등 시스템 자체에 대한 보안장치를 강화해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정보화 마을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전자정부 구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차세대 전자정부통합망 기반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지방정보화 촉진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행정정보를 연계하고, 전자정부 핵심 전문인력 양성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본문
KTV 국정와이드 (39회) 클립영상
- 경기 침체 탈출은 3년간 구조조정 성과 47:33
- 자본시장 CEO포럼 47:33
- 불법파업 엄정 대처 47:33
- 전후 납북자 생사확인 협의키로 47:33
- 납북자 문제 더 큰 틀서 노력 47:33
- 검찰 성범죄자 구속수사, 정신감정 병행 47:33
- 사회 서비스분야서 일자리 창출 47:33
- 연내 법률 개정 47:33
- 참여정부 농정 3년평가 과제 47:33
- 정부, 전자정부 구축 세계적 수준까지 끌어올려 47:33
- 선거개혁 정치문화 투명화 47:33
- 지방선거 후 세금논쟁 의도없어 47:33
- 북·미, 7일 뉴욕서 위폐논의 47:33
- 逆모기지, 노후 대책 준비될 수 있을까 47:33
- 逆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은 47:33
- 한미 FTA, 머리를 맞대자! 47:33
- 당정, 민방위 교육시간, 편성연령 단축 47:33
- BTL로 국립대 기숙사 수용률 확충 47:33
-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 47:33
- 농림부 `최근 국내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없어` 47:33
- 개나리·진달래 1주일 일찍 핀다 47:33
- 순간포착 47:33
프로그램내 인기영상
최신뉴스
-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격상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행정·안전·질서 정책은?
-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 예산사용 내역 불투명? 사실과 달라" [정책 바로보기]
- 오늘의 날씨 (26. 02. 24. 09시)
- 특별한 정월대보름···36년 만에 '붉은 달'과 만난다
-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을 원하는 성인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배울 수 있도록 지원
- 2026년 대학 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선정 공고
- 설레는 새 학기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놀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 같은 지원금, 다른 교복값···구매제도 들여다본다
- 공정위, '영원' 성기학 회장 고발···대기업 지정 회피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