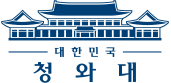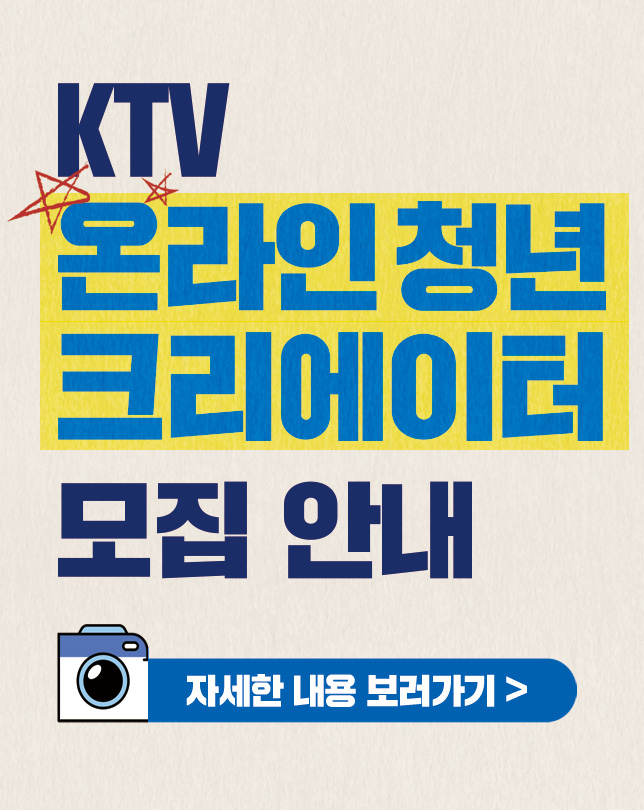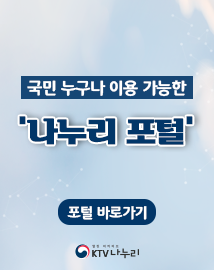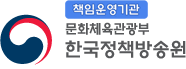`금융개방`이나 `금융허브`라는 말, 특히 이번 한미 FTA 2차 협상을 지켜보면서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동북아의 금융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전략이 국제 경제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의 금융 중심이 되기 위해 용틀임하는 아시아 5개국의 움직임과 그 중 우리나라의 준비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금융허브의 선발주자인 홍콩 정부는 얼마 전 부동산, 주식, 사치품 등의 상속세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세수 감소로 만성 재정적자에 시달려온 홍콩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이같은 조치는 금융과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 국제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기 위함이었습니다.
홍콩과 쌍벽을 이루는 싱가포르도 아시아 국가들의 자산 증대에 따라 최근 자산 운용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로 돈이 몰린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는 등 싱가포르는 외국인 투자의 천국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인 일본과 중국도 서둘러 그 뒤를 좇고 있습니다.
일본은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투자 서비스법`을 예정보다 반 년 앞당긴 지난 4일 시행했고,중국 역시 오는 2020년까지 상하이를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한다는 3단계 전략을 실행 중입니다.
동북아의 용들은 제2의 런던과 뉴욕을 꿈꾸며 금융허브로의 도약에 용틀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달려왔을까.
한국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들에 질세라 아시아 3대 금융허브 도약이라는 목표를 당초보다 3년 앞당긴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하는 등 전략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을 도입하고 외환거래 자유화를 당초 2011년에서 2009년으로 앞당길 계획입니다.
또 국제 규격에 맞는 선진 금융감독 업무 시스템을 마련하고,외국 기관이 보다 쉽게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경영과 생활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금융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전문인력의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고부가가치의 고용창출, 자금조달 비용의 감소 등 많은 효과를 낳게 될 금융허브 건설.
아시아의 용 한국의 힘찬 용틀임이 시작됐습니다.
본문
KTV 국정와이드 (136회) 클립영상
- 노무현 대통령, <수해피해 철저 대비> 당부 50:55
- 노무현 대통령, 여수 엑스포 유치 협조 당부 50:55
-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 지원 50:55
- 태풍·호우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정 해소 50:55
- 피해 복구 여념 군 장병 50:55
- 한은, 비 피해 중소기업 긴급자금 지원 50:55
- 기획처, “수해복구 지원비 신속 집행” 50:55
- 낙동강 하류 홍수주의보 발령 50:55
- 포스코 건설 노동자 해산 촉구 50:55
- 권오규 신임 경제부총리 취임 50:55
- 국세청장 취임 50:55
- 금융허브 기획 50:55
- 한국,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 본격 진입 50:5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멕시코 설문조사 50:55
- 국내 입양 활성화 종합대책 50:55
- UN결의 엄격 준수 50:55
- 조선일보 주택채권입찰제 보도 관련 건교부 입장 50:55
- 한겨레신문 산사태 무방비 보도 관련 산림청 입장 50:55
- 호우 피해 복구 현장 50:55
- 산자부 브리핑 50:55
프로그램내 인기영상
최신뉴스
- 서울·경기·충남 황사 위기경보 '주의'
- "안중근 의사 유묵 귀환 환영···유해 발굴·송환 최선"
- 새 학기 맞아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 국세청, '세금 탈루' 악성 유튜버 세무조사 착수
- 정부,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력 항의···"즉각 폐지해야"
- 靑, '미 관세 판결' 당정청 회의···"대미투자법 협의"
- 이 시각 주요뉴스 (26. 02. 21. 12시)
- 방사청, 캐나다 잠수함 수주 위한 정부지원 확약서 서명식
- "독도 관련 일본 외교연설 강력 항의"···총괄공사 초치
- 원윤종, IOC 선수위원 당선···한국인 3번째·동계 종목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