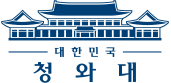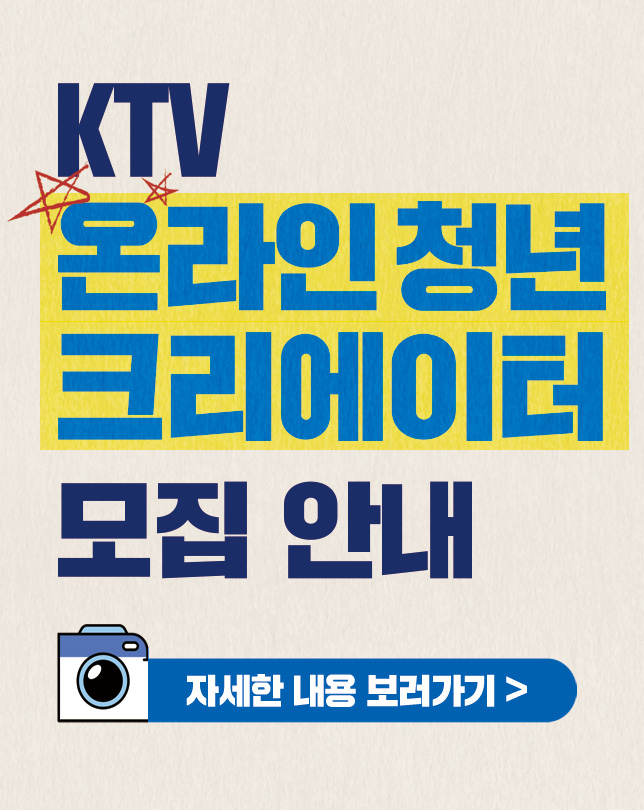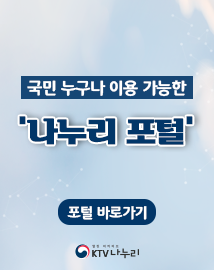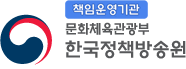정부의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은 출산·보육 및 고용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의 심각성과 함께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불과 20여년 전의 표어지만, 이제 추억 속의 구호가 됐습니다.
그 만큼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빠르고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총인구의 9.3%에 이른 데 반해 4세 이하 영아 인구는 40년 전의 절반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국가의 지속적 발전은 물론 국가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인구 재앙`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러나 출산을 꺼리는 데는 고용불안과 교육문제 등 제반 사회적 여건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문제 또한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사회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어 정책본부를 발족시켜 각 부처의 연구결과를 하나로 모으는 방대한 준비를 통해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둘러보면 저출산 대책의 성공은 정부의 힘만으론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5년도 신생아 수가 1992년 이후 최고수준인 26만 1400명을 기록하는 등 최근 제2의 베이비붐 시대를 맞은 호주.
출산을 국민의 새로운 의무로 내세운 호주 정부의 출산장려책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합쳐진 시너지의 결과입니다.
여성들이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마련해 저출산 극복에 성공한 프랑스와 스웨덴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 또한 정부의 정책이 활용돼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호응한 프랑스와 스웨덴의 기업들과 민간단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나브로 눈앞에 다가온 저출산 재앙의 시대. 그 파고는 높지만 모두의 힘을 합치면 넘을 수 있습니다.
본문
KTV 국정와이드 (108회) 클립영상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47:56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47:56
- `저출산·고령화 추가재원 32조원 문제없다` 47:56
- 벤치마킹 다변화 47:56
- `물류` 이어 `의료허브` 육성 47:56
- 노무현 대통령, `해외나가면 두가지 때문에 놀란다` 47:56
- `EEZ` 독도기점 요구 47:56
-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인 5명 피랍 47:56
- ‘멕시코의 NAFTA 효과’ 긍정·부정 공존 47:56
- 흔들림없이 부동산정책 추진 47:56
- 대·중소기업 수평적 협력관계 확산 47:56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운영 47:56
- 10만원 이상 촌지 교사 파면 47:56
- 외국.혼혈인 실태조사 결과 47:56
- 철도시험운행 8월까지 실시 합의 47:56
- 내일신문 오락실 보도 관련 문광부 입장 47:56
- 국민일보 수출 증가율 보도 관련 산자부 입장 47:56
- 한국일보 ‘술취한 농림부’ 보도 관련 농림부 입장 47:56
-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 점검결과 발표 47:56
-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가이드라인 최종안 발표 47:56
- 대·중소 상생협력 3천억원 펀드 조성 47:56
- 한명숙 국무총리 프랑스 방문 47:56
프로그램내 인기영상
최신뉴스
- 서울·경기·충남 황사 위기경보 '주의'
- "안중근 의사 유묵 귀환 환영···유해 발굴·송환 최선"
- 새 학기 맞아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 국세청, '세금 탈루' 악성 유튜버 세무조사 착수
- 정부,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력 항의···"즉각 폐지해야"
- 靑, '미 관세 판결' 당정청 회의···"대미투자법 협의"
- 이 시각 주요뉴스 (26. 02. 21. 12시)
- 방사청, 캐나다 잠수함 수주 위한 정부지원 확약서 서명식
- "독도 관련 일본 외교연설 강력 항의"···총괄공사 초치
- 원윤종, IOC 선수위원 당선···한국인 3번째·동계 종목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