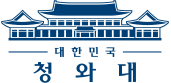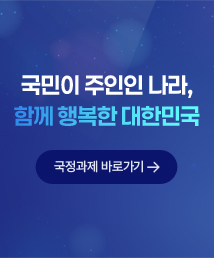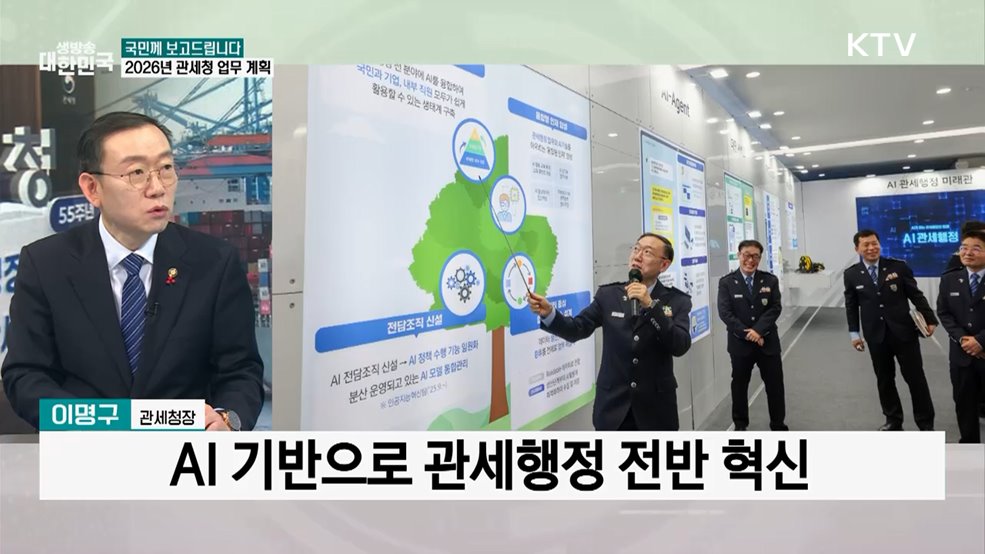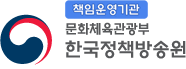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청년 정책 전반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지선 기자, 이번 정책을 보면 그동안 저소득 일부 청년에게만 집중됐던 지원책이 청년 전반으로 확대됐습니다.
일반 청년들에게도 녹록지 않은 현실이 반영된 것 같은데, 어떤가요?
박지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실제 주요 지표를 보면요.
29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지난달 기준 4.9%로 전년 대비 올랐습니다.
고용률은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고용 여건이 악화하는 모습입니다.
구직 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 청년 규모도 2022년 이후부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첫 취업을 하기까지 취업 준비 기간은 지난해 기준 11개월이 넘는데요.
정부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면서 결혼, 출산 등 사회 전체 활력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설명 들어보시죠.
녹취> 윤창렬 / 국무조정실장
"정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첫걸음을 내딛고 스스로 힘으로 자립하여 정책의 주체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들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모지안 앵커>
사실 청년 정책은 이전에도 꾸준히 있었지만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이번 대책에선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박지선 기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청년정책을 별도로 마련한 건 2020년 청년 기본법 제정되면서인데요.
일자리, 주거, 교육 등을 망라한 범정부 청년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주요 지표에서 보듯 청년들의 현실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정부도 이 점에 공감하고 청년 정책의 질적 제고를 위해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정책 수혜 대상을 저소득, 취약 청년에만 국한하지 않고 일반 청년 전체로 넓혀 보편적 청년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순히 연령 차원의 접근이 아닌 생애주기를 지원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사회 진입부터 노동시장 안착, 주거 등 자립기반 마련까지 지원정책을 연계하는 겁니다.
모지안 앵커>
청년 정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무엇보다 청년들 목소리가 잘 반영되어야 할 텐데요.
청년들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고요?
박지선 기자>
네, 먼저 청년들이 청년 정책과 국가 주요 이슈를 논의할 수 있도록 청년과의 국정 대화, 소통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특히 일자리, 주거, 교육 등 핵심 정책에서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권역별 청년 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입니다.
청년들이 직접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하는 전문위원회도 국무조정실에 마련됩니다.
주거, 일자리 등 주요 정책 6개 분과로 구성됩니다.
현재 정부 소속 위원회에 청년 위원 비율이 10% 정도인데요.
청년 위원 위촉을 더욱 확대해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온라인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나이, 소득, 지역 등을 입력하면 맞춤형 청년 정책을 추천해주는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모지안 앵커>
네, 지금까지 청년 정책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박지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